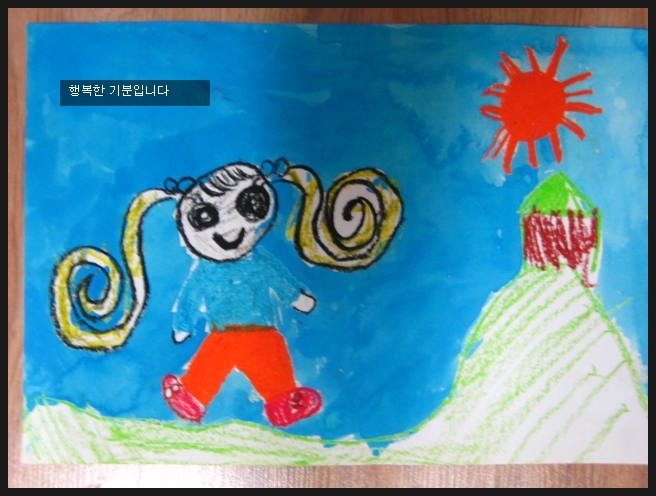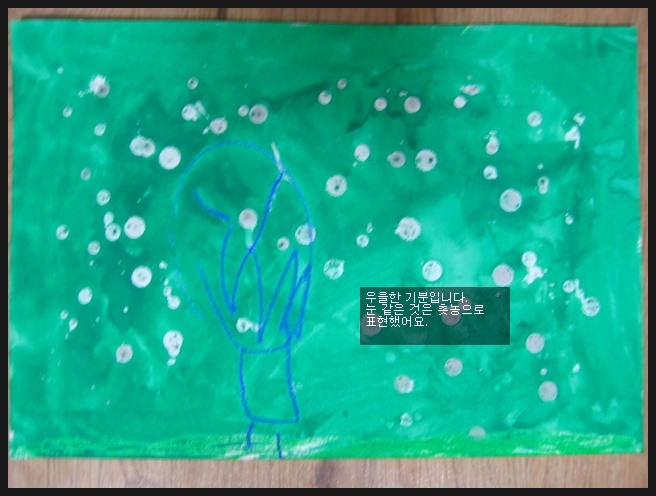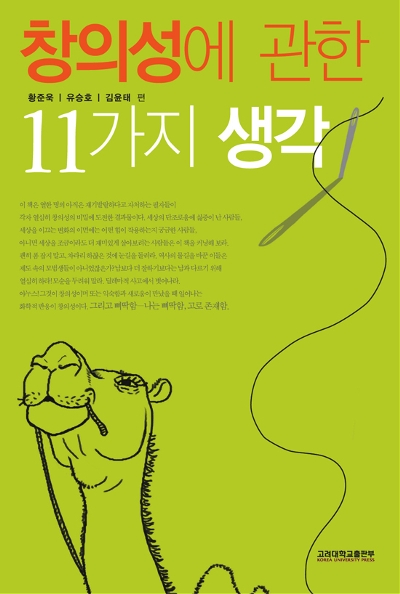맥스웰이 이제까지 전기장과 자장이 따로 연구되다가 전자기장이라는 현상을 이론화하는데 새로운 이론체계를 만들기 전에 비주얼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어떤 이미지가 먼저 왔다는 것이다. 전자기장은 바퀴나 도르래의 집합체처럼 움직인다고 했다. 원자는 작은 태양계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지식의 단초가 은유(metaphor)였다. 과학에 있어 창조는 메타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아인슈타인도 특수상대성이론을 끝내고 일반상대성이론을 정식화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어마어마한 주사위가 나타났다. 비주얼 이미지를 보고 일반상대성이론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파인만은 천재적인 과학자는 예술가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학과 예술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에 길포드(Guilford)가 '인간 지능의 본성'이라는 책을 냈다. 인간이 두 개의 모델로 작동하는데 컨버전과 디버전 사고다. 컨버전은 단 하나의 답을 찾는 데 작동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디버전 사고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개의 답을 뱉어내는 사고방식이다. 두 개가 변증법적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제하, 해방 이후 학교 교육은 컨버전 사고만 강제하고 있다. 단 하나의 정답, 밑줄 하나 긋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을 1~4번 중에 찍는 것이다. 비슷해도 틀렸다고 한다. 생각의 매커니즘을 수렴적(컨버전) 사고에다가 찍어 내고 있다. 예술가의 창조는 대부분 디버전 사고에서 나온다. 어떤 한 문제에 골몰하다가 전혀 엉뚱한 데서 답을 찾게 된다.
모차르트의 지각구조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다.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 누구도 없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다. 음악은 시간의 시퀀스 안에서만 지각된다. 4소절까지 들어야 음악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몇 소절 지나면 앞에 소절을 잊는다. 그래서 반복시켜서 음악 전체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들려지는 음악만 지각할 수 있다. 앞은 망각되고 뒤의 것은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차르트는 첫음과 끝음을 동시에 듣는다. 이게 가능한가. 구라 아닌가. 인간이 지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아마 구라일 것이다. 단 모차르트는 음악을 비주얼 이미지로 지각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음악을 건축으로 환치해서 지각했는지도 모른다. 음악과 제일 가까운 게 건축이다. 두개 다 일정한 단위를 쌓아 올린 것이다. 부분들이 서로 연결돼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음악과 건축은 같다. 문학은 언어로 현실을 재현하고, 건축, 미술도 바깥에 오브제가 있지만 음악은 그게 없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건축적이다. 그게 특이체질이 아니었나 싶다.
모차르트의 편지를 보면 아버지, 사촌에게 보낸 게 천양지차다. 아버지에게 보낸 것은 항상 감시하고 있는 초자아(super ego)다. 아버지는 모차르트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상당히 조리가 있다. 때문에, 때문에로 이어지는 논리적 기술을 하고 있다. 반면 사촌누이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방귀, 똥, 엉덩이, 쓰레기다. 프로이드 식으로 말한다면 모차르트에게는 항문기 도착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콜로레도 주교에게 퇴짜 맞고 나올 때 대주교를 향해 엉덩이를 보이고 나온다.
창의성과 몰입
모차르트가 우리 초등.중등학교에 왔으면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보여줬던 모차르트 신화의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심리학자들이 추정하는 그의 아이큐는 120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신이 점지한, 인간세계에 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 창의적인 사람, 아이큐가 높을 것 같지만, 여러 조사에 따르면 창의성과 아이큐는 거의 무관하다고 한다. 아이큐가 100이하인 사람에게는 창의적인 업적이 안 나왔다고 한다. 100이하면 침팬지 정도인데 그것이 아닌 보통 120정도면 창의적인 업적을 낸다는 것이다. 아이큐는 성격, 환경에 비해 영향을 덜 미친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스탠포드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은 20년 장기관찰 프로젝트를 실시해 147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결론은 실제 천재는 천재로 남아 있지 않았다. 1400명 중에 대부분이 공무원이 됐다고 한다. 대법관 2명, 지방판사 2명이 나왔고 오히려 여기서 떨어진 사람 중에 노벨상이 나왔다. 인지심리학자의 얘기는 140이냐 150이냐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리암 허드슨의 DT(divergent thinking)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큐 높은 군과 낮은 군을 보면 낮은 군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
우리 사회에서 모차르트는 병원에 가거나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야 한다. 다행히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홈스쿨링을 받았다. 이게 문제다.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면 솔직히 서울대, 연고대 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 다니는 애들은 컨버전 사고로 나온 것으로 모든 자기의 능력을 재단하고 콤플렉스가 있다. 인생 전체가 그것으로 멍든다. 수능시험 5지선다 찍기로 20~30년까지 결정된 순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것을 디버전 사고로 해 보면 다르다. 인류에게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할 기회가 우리 교육풍토에서 원천봉쇄 되거나 멸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산만하기만 하면 창의적인가? 산만하기만 한 아이들도 많다. 저희 학교 영상원은 좀 산만한 아이들을 뽑는다. 그런데 계속 산만한 애들도 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산만해 보이는 디버전 사고와 또 하나가 필요하다. 몰입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퐁당 빠지는 것이다. 제가 총장 하면서 예술과 과학이 만나야 한다고 하니까 포항공대와 친해졌다. 포스텍 총장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추천했다. 그것을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었다. 여러 심리학자들의 조사를 종합해 놨는데 세계수준의 전문가, 마에스트로가 되는 자들을 보니까 1만 시간, 에누리 없이 1만 시간을 몰입을 했더라는 것이다. 하루 8시간 몰입을 하면 10년 걸린다. 몰입이란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망각돼 버린다. 밥도 잊고 잠도 잊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시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소설가, 체스 챔피언, 심지어는 완전범죄에 가까운 숙달된 범죄자들을 보니까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몰입을 했다. 베를린음대의 학생을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 1만 시간 몰입한 이들은 솔로로 나가고 8000시간은 오케스트라단원, 4000시간 몰입한 이들이 음악교사를 하더라. 빌 조이, 빌 게이츠, 심지어 비틀즈도 1만 시간이 넘었다. 그 시기가 한 14살~16살, 중학교 2,3학년이나 고1,2에서 대학교 3학년까지가 제일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을 봐야 한다. 10대에서 20대 초반에 1만 시간 몰입했느냐가 한 분야에서 창의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큰 조건인 것 같다.
제 경우 시에 처음 눈뜬 게 중3때였다. 형님의 일기장 앞에 나오는 릴케의 시 '고독'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버렸다. 그러면서 시에 전염돼버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내 머리 위로는 시였다. 시를 이고 다녔다. 꿈에서도 썼고, 한참 고은 선생의 시가 나왔을 때 거기 빠졌다. 어떤 시는 내가 쓴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풍덩 빠졌다. 그 나이, 그것만 하면 밥도 안 먹어도 되는 것, 예술이 됐든 과학이 됐든, 체스가 됐든. 우리 아이들이 가진 능력을 심해에 집어넣어서 몰입시키면 폐활량이 커져 어느 분야에서든 창의적 일을 할 수 있다. 컨버전 사고로 재단돼 있는 수능, 아이큐에서 빨리 해방시켜 좋아하는 분야에 풍덩 빠지게 해야 한다.
제도교육의 커리큘럼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방법이다. 수렴적 사고로 단련이 돼 양산하고 있는데 디버전 사고를 할 수 있는 교과내용, 교재개발, 교육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EBS 방송을 보면 범죄다. 3번이죠, 찍어요다. 죽여 버리고 싶다. 큰일이다. 정 안되면 대안학교를 만들던가. 지금 우리 교육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속에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사장되지 않게 시민단체들이 각별히 연구도 하고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 > 톡톡튀는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의성 교육 (0) | 2010.01.26 |
|---|---|
| [서평]사회성, 창의성지수 향상을 위해 미국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영어동요 (0) | 2010.01.26 |
| "EBS 수능 방송은 범죄다"-황지우 시인이 말하는 '창의성, 교육, 예술' 2 (0) | 2010.01.26 |
| 서평) 미술관에 간 꼬마 피카소를 읽고 - 창의성 쑥쑥, 감성도 쑥쑥 (0) | 2010.01.26 |
| 창의성교육에 필수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퍼포먼스 교육 (0) | 2010.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