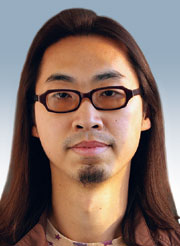
“갈피를 못 잡겠네. 큰손들도 왔다갔다 하고.”
“역시 중국쪽으로 움직여야 하나?”
서울 여의도의 비즈니스 타워에서, 압구정동의 백화점 카페에서 소란스런 대화들이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이야긴가. 주식, 부동산, 모두 맞다. 그러나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관심 속에 활황의 기치를 올리다가 최악의 충격타를 연이어 맞으며 비틀대고 있는 미술시장이다.
몇 년 전 만해도 미술품의 수집과 투자는 일반인들에게는 생경했던 세계다. 그러나 뉴욕 소더비, 홍콩 크리스티, 일본 신와 옥션 등 세계 시장의 동시 활황 속에 국내에서도 미술 경매시장이 2000억원대로 커졌다. 미술 투자 역시 전문 미술인이나 기업의 차원을 넘어 개미 투자자들에게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여성 잡지들은 미술 투자 관련 특집을 게재하고, 케이블TV 채널은 인기 미술인의 강연과 더불어 아트 펀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제야 본격적인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지표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연초부터 줄줄이 터져나온 미술계의 갖가지 사건들은 시장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미술대전 비리, 대작가의 위작 시비, 대필과 학력위조 등 사안 하나 하나가 미술계 전반에 불신을 불러올 만큼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실제 미술시장은 하반기로 오면서 급속히 경색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K옥션의 경우 7월에는 90%를 넘어서던 낙찰률이 11월 들어 70%로 떨어졌다. 미술시장 역시 주식, 부동산처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그 가치의 대상이 다분히 주관성을 띠는 ‘예술품’이라는 면에서 더 복잡한 게임이 된다.
미술 창작자들 역시 미술계에 몰려오는 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 작품의 가격이 뛰어오르는 현실은 당연히 창작의 의욕을 고취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작가, 특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작가만 부각되는 부익부빈익빈의 시장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때 설치 미술이 주를 이루었던 미대에서 최근 붓을 드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회화’에 시장이 집중되면서 생겨난 움직임이다.
‘돈이 되는 작업’에 매달리는 모습이 예술가답지 않다고 여길지 몰라도 큰 덩어리의 예술세계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술 창작자들은 운동선수들처럼 특정한 재능에 올인해야 한다. 지망생 모두에게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오히려 메이저리그의 박찬호처럼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미술인이 얻어내는 ‘잭팟’이 더 큰 동기를 부여할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 미술 창작자들과 투자자들은 세계 시장의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 김아타, 배병우 등의 작품은 뉴욕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국내 미술 자본은 세계 미술계의 블루칩이 된 중국의 현대 작가들에게 달려간다. 분명한 대세 속에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들은 적지 않다. 몇몇 큰손, 혹은 작전세력이 미술시장의 가격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신감이 가장 크다. 소수가 만들어내는 널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작은 투자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을 붙잡고 무게를 늘려가야 한다. 저변의 확대와 미술품 평가의 투명화는 함께 굴러가야 할 두 바퀴다.
이명석 문화비평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이디어 > 톡톡튀는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테마진단]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까닭은 (0) | 2008.02.08 |
|---|---|
| [기자24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버려야 (0) | 2008.02.08 |
| [사설] 검찰, BBK (0) | 2008.02.08 |
| [해외논단]엇박자 보이는 美·中 관계 (0) | 2008.02.08 |
| [사설]주택담보 대출금리 상승 너무 가파르다 (0) | 2008.02.08 |